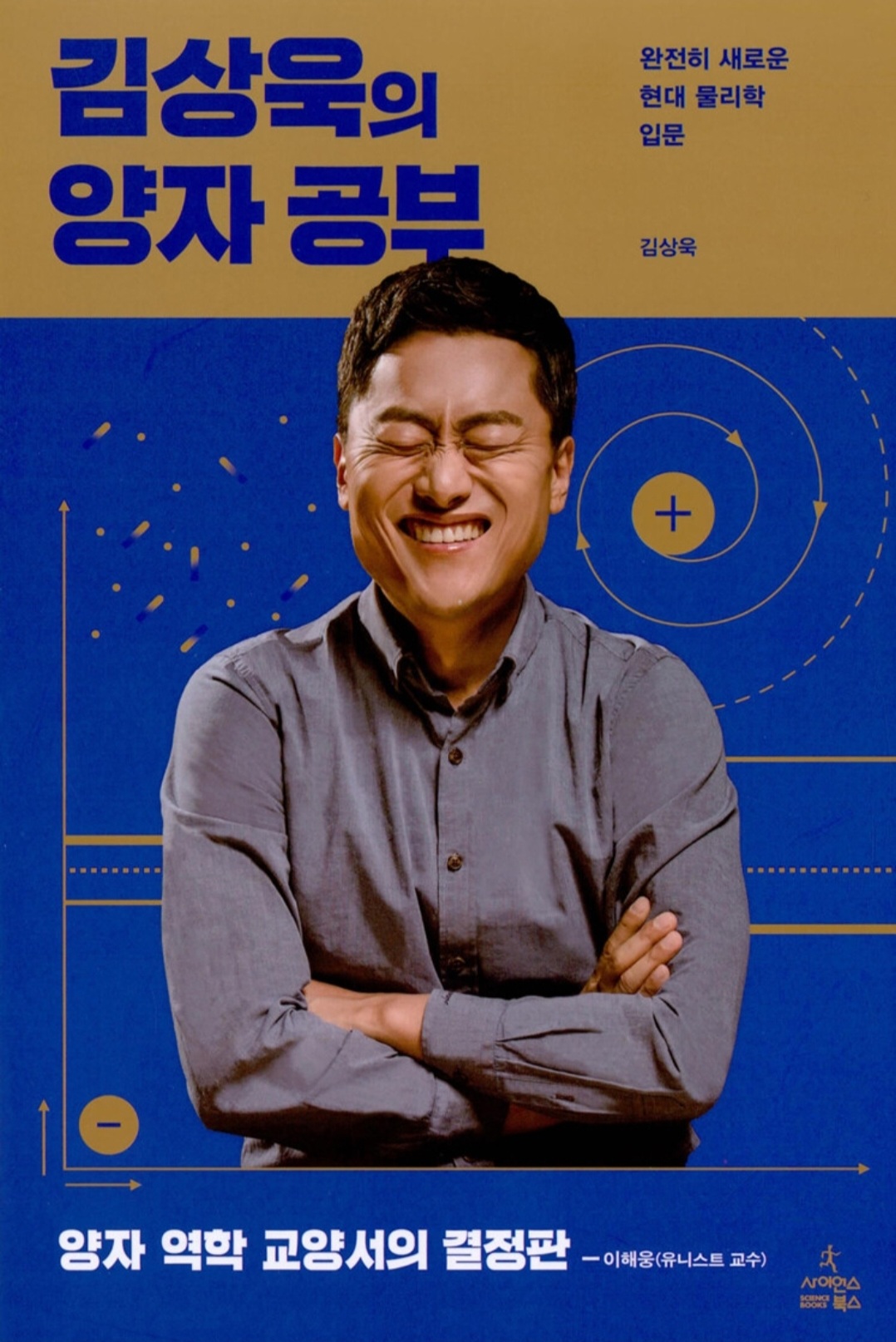
양자 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 -리처드 파인만
아무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좋은 핑계가 된다. 이해하지 못할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가뜩이나 과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도 한구석에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망설이다 책을 구매하고, 또 오랜 기간 방치하다가 책을 읽게 되었다.
'수식이 많으면 어쩌지......', '수식이 없더라도 너무 어려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굉장히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양자 역학을 깨우치는 경지에 오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의 일부가 해소되고, 책의 논리를 대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었다.
1장은 "우리 세상이 양자 역학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면?" 하는 가상으로 시작이 된다.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이번에 들어오는 야자 열차는 해운대로 갈 확률이 35%, 부산역을 갈 확률이 65%입니다. 열차가 정확히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니 항상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운대와 부산역은 정반대다.
양자 역학의 특징인 측정 불가능에 대한 부분이다.
원자 단위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는 사뭇 다르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에 놓인 놀구공이 원자핵이라면 전자는 서울 외곽에 위치할 정도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사실상 모두 텅 비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냥 통과하지 않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측정을 하려던 과학자들은 번번이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이 실험은 [이중 슬릿 실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중 슬릿이란 구멍이 두 개라는 뜻으로, 벽에 구멍을 두 개를 뚫고 전자를 쏘는 실험이다. 그런데 이 전자라는 녀석은 어떨 때는 야구공처럼 입자의 성질을 띠고, 어떨 때는 물결처럼 파동의 성질을 띤다. 마치 고체면서 액체이기도 한 고양이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 것을 [중첩 상태]라고 한다. 측정할 수 없는 전자, 아니 측정하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전자의 상태에 과학자들은 설왕설래한다.
자 이제 다시 전철역으로 가보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전철이라니…. 승객들도 혼란스러워한다.
갑: 나는 그동안 양자 열차를 매일 이용해 왔는데, 지금까지 열차가 도착한 역을 확률로 계산하면 거의 정확히 35%는 해운대역, 65%는 부산역이야.
을: 아니 그렇다면 누군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건가?
갑: 절대 그렇지 않다네. 이게 우리 지하철의 미스터리지. ‘안슈탄’이라는 이가 열차 운행을 배후 조종하는 이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하지만 부산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결국 졌다더군, 그 바람에 ‘상대송’ 아파트 분양으로 번 돈을 몽땅 잃었다네.
이 책의 ‘킥킥’ 포인트다. 과학자의 유머랄까? 실제로 킥킥 웃었다.
상대성이론의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카페로 가서 차 한잔 하려고 쉬려고 하는데 카페가 이상하다. 자리가 많은데도 하나의 의자에 5명이 같이 앉아 있었다.
국숫집은 더 가관이다. 네 명의 손님과 주인이 있는데 모두 뛰고 있다.
“지금 오신 분은 시속 18킬로미터로 뛰어주세요.”
주인의 요구에 앉아서 천천히 쉬고 싶다고 하자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자기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먹으니 이번에는 주인이 시속 16킬로미터로 뛰는 것이 보였다. 속도를 맞바꾼 것이다.(여기서 살짝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왜 시속 18킬로미터가 아니라 16킬로미터인가요?)
양자 역학에서 기본 입자를 보스 입자(보손)와 페르미 입자(페르미온)로 나눈다. 페르미온은 하나의 양자에 하나의 입자만 있을 수 있지만 보손은 그렇지 않다.
만약 인간이 페르미온이라면, 내가 초속 1미터로 움직이는 상태에 있다면, 내 방에 들어온 누군가는 초속 2미터로 움직여야 한다. 하나의 상태에 하나의 입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방금 전 국숫집이 바로 페르미온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파울리의 배타 원리]라고 한다. 보손은 여러 개의 보손과 공존할 수 있다. 한 의자에 여러 명이 앉아 있던 카페처럼 말이다.


책의 예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엔트맨과 와스프]가 뒤늦게 이해되었다. 이 영화에는 ‘고스트’라는 빌런이 나온다. 자유자재로 사물을 통과하는 ‘페이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체를 알고 보니 그는 그 현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미시세계의 원자는 입자일 수도 파동일 수도 있는 두 개의 상태를 가진다. 그러나 거시 세계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슈뢰딩거 고양이의 역설]이다. 이 역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답을 ‘결어긋남’에서 찾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파동은 여러 개의 줄무늬, 즉 간섭무늬를 보이지만, 파동이라도 결이 맞지 않으면 간섭무늬를 보일 수 없다. 인간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물질과 작용하는 것은 결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파동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영화 속의 고스트는 어떤 실험으로 결어긋남과 결 일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만진다고 볼 수 있다.
"양자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려다가 좌절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위안이다.
우리 세계는 원자로 일루어져 있고, 양자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 모른다고 해도 양자 역학은 오늘도 잘 작용하며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있다.


'책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안 읽어도 아는 척 하는 방법 (0) | 2022.07.09 |
|---|---|
| 휴가 책 추천 3탄 - 에세이 추천 (0) | 2022.07.08 |
| 야마구치 슈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 <뉴타입의 시대> (0) | 2022.06.24 |
| 책과 함께 하는 여름 휴가 책 추천: 인문학 편 (0) | 2022.06.18 |
| 여름 휴가 책 추천: 미술 편 (0) | 2022.06.14 |




댓글